정권교체 때마다 뒤바뀐 대북정책, 남북관계 일관성 상실 심화 정당정치에서 지속가능한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기반 복원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 「국내정치와 남북관계: 초당적 합의기반을 찾아서」 브리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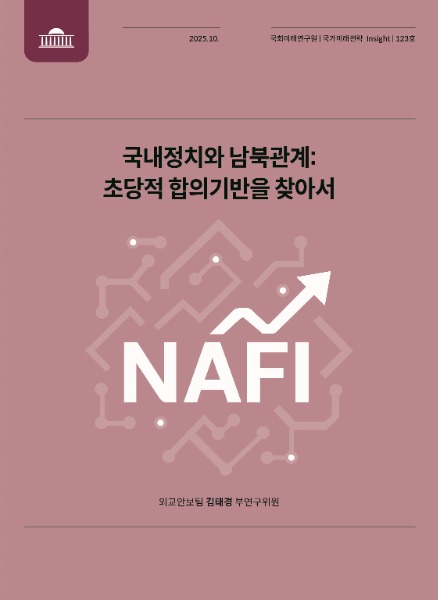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30일(목)에 “국내정치와 남북관계: 초당적 합의기반을 찾아서” 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역대 정권의 남북관계를 분석하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정권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면서 초당적 합의기반이 약화된 배경을 제시하는 한편,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초당적 합의기반 복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30일(목)에 “국내정치와 남북관계: 초당적 합의기반을 찾아서” 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역대 정권의 남북관계를 분석하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정권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면서 초당적 합의기반이 약화된 배경을 제시하는 한편,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초당적 합의기반 복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민주화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부터 참여정부(1988-2008년)까지는 대북정책의 일관된 기조가 유지되었으나, 2008년 이후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의 기조와 이행이 크게 달라지면서,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되어, 2024년 서울대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한 응답은 36%로 2007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부정 응답은 35%로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2018년 54.2%에서 2024년 22.4%로 급감했고, 부정 응답은 17.6%에서 47.4%로 급증했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긍정 응답은 52.9%에서 23.9%로 감소하고, 부정 응답은 19.75에서 45.0%로 증가했다.
브리프는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반도 외부환경 변화, ▲국내 정치적 요인, ▲민족공동체 의식 및 경제사회적 이해 등에 근거한 시민사회 합의기반 등 세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탈냉전과 민주화 시기를 거쳐 2008년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긴장완화, 평화공존, 교류협력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한반도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수 정권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보수ㆍ진보 정권을 떠나 유지되던 초당적인 대북정책 기조가 부정되고, 한반도 외부환경과 국내정치, 시민사회 동학이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상호인정, 긴장완화, 화해협력, 단계적 통일론의 복원을 시도했으나, 국내정치의 양극화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최근 계엄ㆍ탄핵 정국에서 시민사회를 둘러싼 양극화는 한층 첨예해졌다고 분석했다.
브리프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극화, 분열된 정치지형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탈냉전기 초당적으로 이어온 대북정책 기조의 복원과 ▲중장기 미래 관점에서 ‘메타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복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먼저 대북정책 기조 복원과 관련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의 사실상 상호인정을 전제로 평화공존, 화해협력, 단계적 통일 지향이라는 기본 기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보수ㆍ진보 정권은 7.4 공동성명의 3원칙을 계승했고, 6.15 공동선언은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10.4 선언은 6.15 선언과 기본합의서를 명시적으로 계승한 바 있다. 이러한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했던 전통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리프는 특히 엘리트 정당정치 차원에서 초당적 합의기반 복원을 통한 초당적 수렴의 노력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시민사회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의 핵심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정당정치 구조에서 보수 정당은 남북관계에 대해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다수 여당이 초당적 합의기반 형성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양당 간 정책 수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장기 미래 관점에서 ‘메타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의 복원은 상호 진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고, 공유 인식의 저변을 넓히는 사회적 대화 모델을 확산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 미래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유의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미래상을 둘러싼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에 기초한 다수 유권자의 지지 확대는 정당 간 초당적 수렴을 뒷받침하여, 지속가능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및 한반도 해법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



